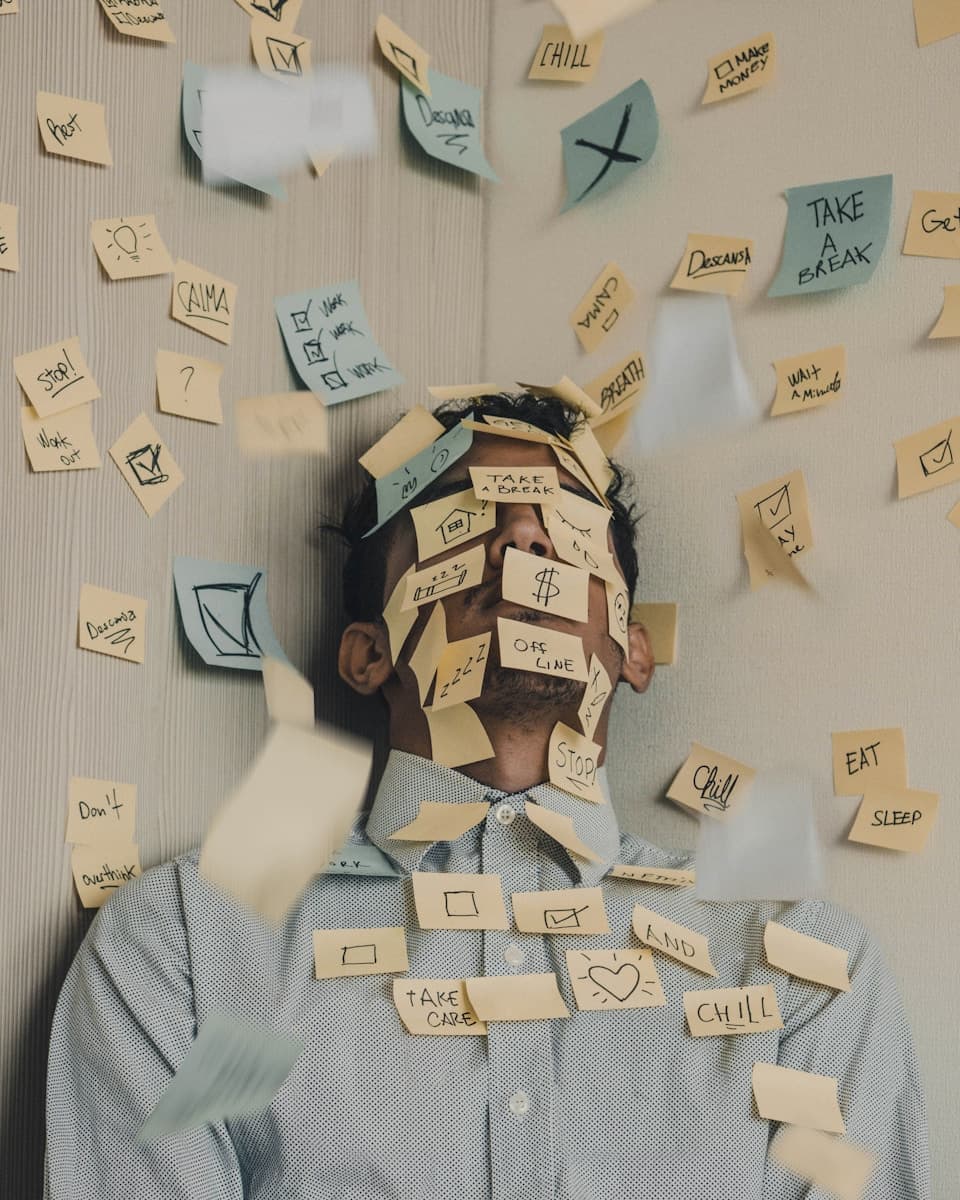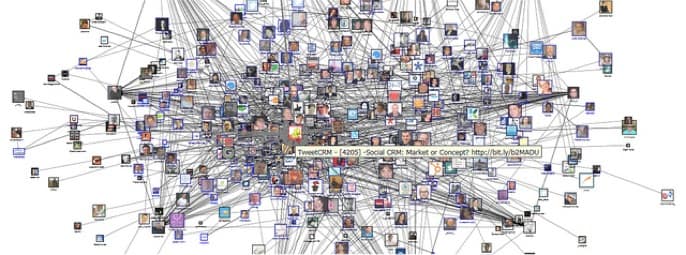조조가 진궁에게 말했다.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사람을 쓴다거나, 부린다거나 하는 말에서나 ‘용병(用兵)’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복잡한 뜻에 있어서나, ‘올바르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전쟁터에서의 지휘관이란, 아무리 유능하다 하여도 결국엔 병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대한 희생’을 통해 성취된 영광에 더 주목하곤 한다. 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스러져간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이나, 80년대를 넘어오기 위해 스스로의 삶이 부스러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기억, 달콤한 안락의 뒷골목에 감추어진 부적응자들과 패배자들에 대한 시선은, “위대한 대한민국”, “미래로 도약하는 OO기업” 등의 구호 속에 파묻혀버리기 마련이다. 그들은 모두 불가피한 희생자(casualty of war)로 간주되어버리는 것이다. 도피하는 조조를 대접하려 돼지를 잡다 몰살당한 여백사의 가족처럼 말이다.
B.브레히트씨는 “위대한 승리”를 칭송하기 위한 희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회가 어떤 특정한 도덕에 대해서 유별나게 강조하는 경우, 반대로 그 사회는 어떤 사회적 폐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http://dsl.german.or.kr/cf98fall/hssung.htm)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오래도록 칭송받고, ‘희생제의’를 통해 집단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 인류 문명과 함께 계속되었던 까닭은, 그것이 불가피한 폭력이요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정 그러한가?
그 희생의 대상이 스스로이거나, 자신의 소중한 누군가여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조조는 그의 장남 조앙과 조카 조안민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위의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을까? 아마도 그의 인간형으로는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수하들은 그런 조조의 모습을 보며 뭉클한 감동에 사로잡혀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하지만 말이다. 자기 자식이나 가족을 스스럼없이 희생물로 삼을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진정 위대한 결단력을 가진 자로 칭송해야 하는 걸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제단위에 올려놓고서야 신의 은총을 받았다. 그토록 자애롭고 정의롭다는 ‘하나님’은 왜 그에게 아들을 요구했던 것일까? 그것이 비록 시험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라며 기도하게끔 명령한 십계명과 그의 시험은 설명되지 못하는 모순이 아닐까?
위기를 부르짖고 지도자가 그 구성원에게 희생과 단결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 지도자가 결국은 스스로의 무능과 위기를 감추기 위해서 ‘위대한 희생’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은 그가 “세상사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 두려워 세상 사람들을 버리는” 것은 아닐지…